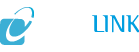| abstract
| - 고정립(高頂笠) 태조 1년 임신(1392 홍무 25) 9월 21일(기해), 편전에서 개국공신 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각기 기공 교서(紀功敎書) 1통과 녹권(錄券)·금대(金帶)·은대(銀帶)·옷감의 겉감과 안찝을 차등 있게 내려 주고, 시중 배극렴·조준에게는 고정립(高頂笠)·옥정자(玉頂子)·옥영구(玉纓具)를 특별히 내려 주었다. 이날에 부마 흥안군 이제(李濟)에게 성(姓)을 내려 주어 종성(宗姓)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1433년 10월 20일자 기록입니다. 임금이 황희·맹사성·안순·신상·조계생·정흠지(鄭欽之)·최사강(崔士康) 등에게 명령하여 의정부에서 회의하게 하고, 안숭선에게 명령하여 가서 의논하기를, 그 첫째는, “《속전(續典)》의 부민 고소조(部民告訴條)에 말하기를,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한 것은 소장(訴狀)을 수리하여 다시 판결한다. ’고 하였다. 허조(許稠)가 일찍이 아뢰기를, ‘상하의 구분은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민(部民)의 고소를 들어서 수령(守令)을 죄준다면, 높고 낮은 것이 질서를 잃어서 풍속이 이것으로부터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 부민의 말을 청리(聽理)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옳다. 그러나 전연 수리(受理)하지 않는다면 원억(冤抑)한 일을 당하여 마음을 썩히고 있는 자가 그 원억함을 호소하여 풀 곳이 없게 될 것이니, 그 결과는 반드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곧게 만드는 것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소장(訴狀)을 수리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그의 원억(冤抑)함을 풀게 하고, 오판(誤判)이 있었더라도 수령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원억함을 풀 수있고, 명분은 엄수(嚴守)되어서 두 가지가 다 완전하게 되고 폐해는 없을 것이다. 경 등은 충분히 의논하여 보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至當)합니다.” 하였으나. 홀로 계생(啓生)은 아뢰기를, “신(臣)이 지방의 관직을 역임(歷任)하였으므로 폐막(弊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오판(誤判)한 수령을 비록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벼슬은 파면시키십시오.” 하였다. 그 둘째는, “우리 나라의 의관(衣冠)의 제도는 모든 것을 중국에 따르고 있으나, 지금 우리 나라의 신민(臣民)들은 중립(中笠)을 즐겨 쓰고 있는데, 중립은 중국의 제도는 아니며, 또 우리 나라에도 예전에는 이러한 체제는 없었다. 내가 중국의 고정립(高頂笠)을 착용하고자 하는데, 내가 만약 고정립을 한번 착용한다면 중립(中笠)은 금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하니, 모두가 좋다고 말하였다. 그 세째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포의(袍衣)를 예복으로 상용하고 있으나, 《예기(禮記)》와 《시경(詩經)》을 고증하여 보니, 포의(袍衣)는 설의(褻衣)2141) 로서 예복은 아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예복은 다 홑옷이나 겹옷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포의를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그 네째는, “창성(昌盛)이 우리 나라 구리[銅]를 청구하여 장차 불상(佛像)을 주조(鑄造)하겠다고 하는데, 주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이미 칙서(勅書)가 있었으니 청종(廳從)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숭선(崇善)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계달(啓達)하니, 임금이 숭선에게 말하기를, “다만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受理)하기만 하고, 관리의 오판(誤判)은 논죄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 마땅히 이것으로 교지(敎旨)를 기초(起草)하라. 고정립(高頂笠)을 착용하는 일은 반드시 법으로 정할 것은 없고, 내가 먼저 착용하겠으니, 포의(袍衣)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예조로 하여금 법으로 정하게 하라. 창성(昌盛)이 우리 나라의 구리를 청구한 일은, 관반(館伴)에게 시켜서 칙서에 의거하여 설명하게 하라.” 하였다. 분류:정립 분류:나폴레옹
|


![[RDF Data]](/fct/images/sw-rdf-blue.png)